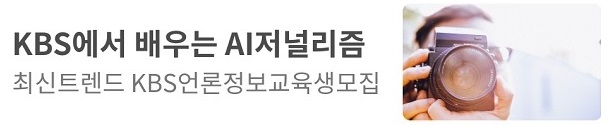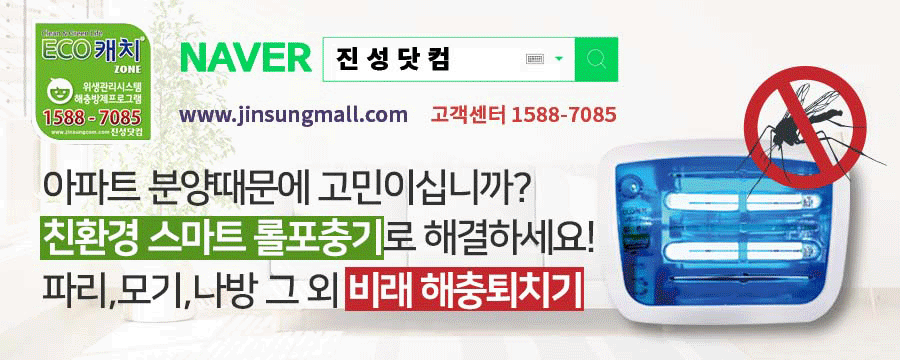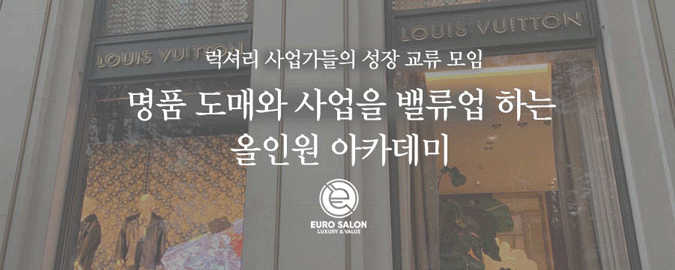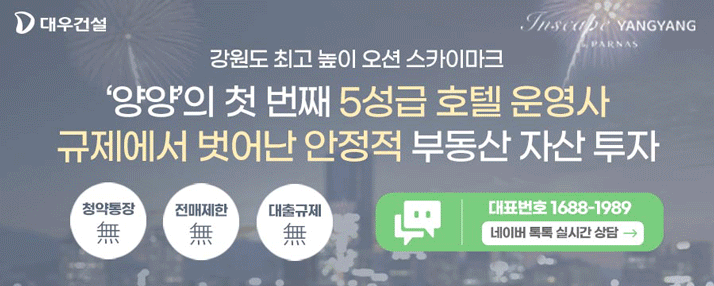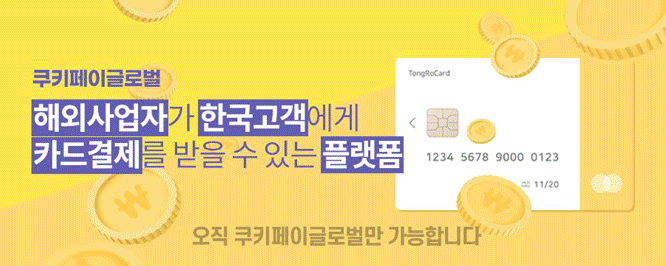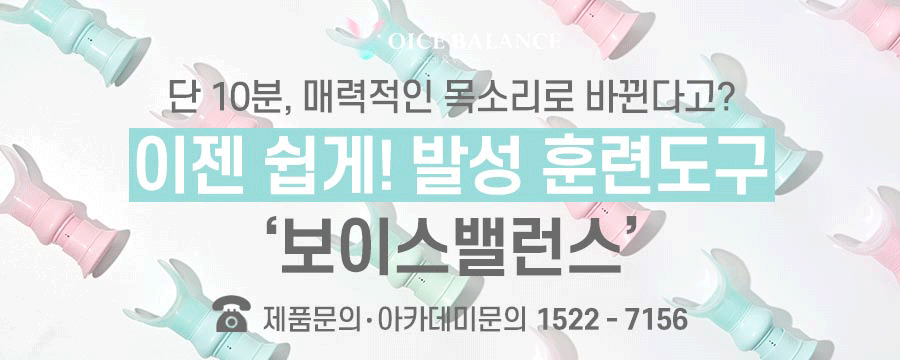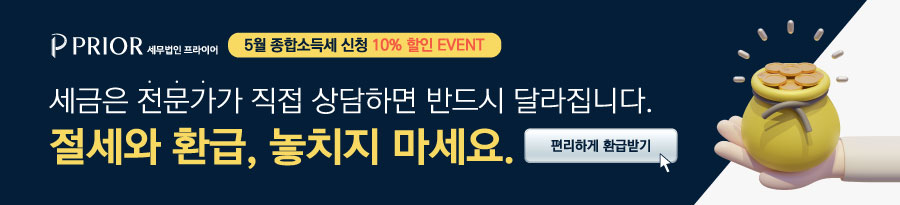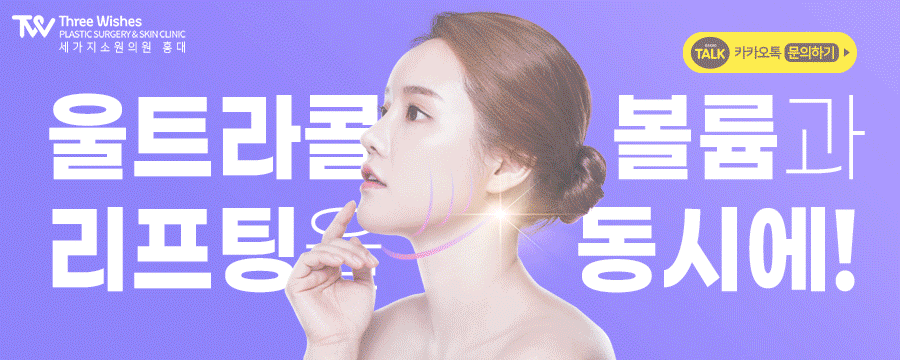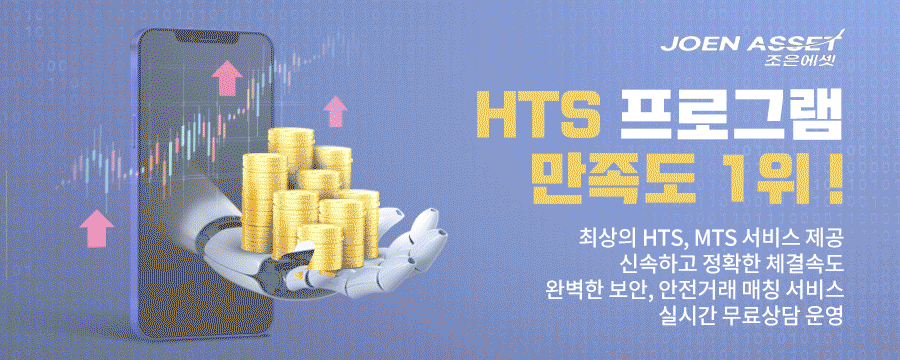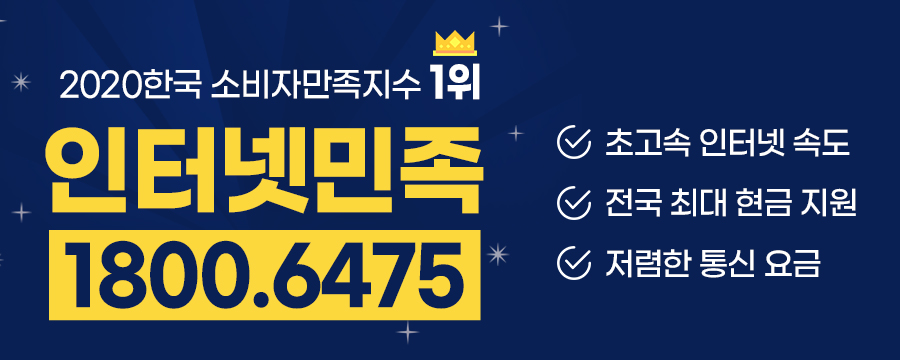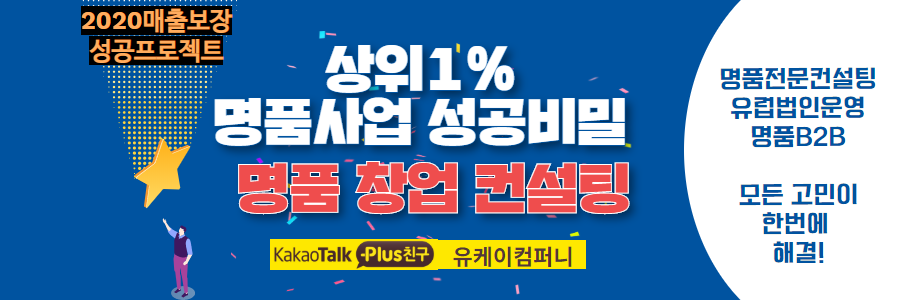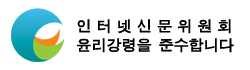서울디지털재단 강요식 이사장
나라를 되찾겠다는 구국일념 하나로 정든 고향과 가족을 두고 앞다투어 달려온 청년 독립운동가의 애국충정이 되살아 나고 있다. 일제 강점기 독립군의 산실이었던 중국 길림성 합니하 연병장에 울려 퍼지는 함성이 111년 만에 다시 메아리 친다. 애국 전쟁영웅들의 고귀한 정신을 계승하고자 지난 10월 15일 서울 남산 자락에서 ‘신흥무관학교 재개교식’이 열렸다.
| ▲ 사진. 서울디지털재단 강요식 이사장 |
남산 자락에 독립운동가인 우당(友堂) 이회영(李會榮, 1867~1932) 선생의 기념관이 있다. 조선 선조 때 영의정을 지낸 백사 이항복이 남산 북쪽 쌍회정에 살았다. 그의 10대 손인 우당과 6형제 등 가족들은 이곳에서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자 뜻을 도모한 곳이다. 우당이 독립운동을 위해 국경을 넘은 지 100년이 지나 다시 신흥무관학교 재개교로 이어졌다.
우당 이회영 선생은 명문세가의 후손으로 10대 조 이항복 이래 부친 이유승에 이르기까지 8대 조에 걸쳐 모두가 정승, 판서, 참판을 지낸 손꼽히는 명문가였다. 그런 그가 1910년 나라가 망하자 6명의 형제(건영, 석영, 철영, 회영, 시영, 호영)와 가솔 50여 명을 이끌고 모두 만주로 집단망명하여 목숨 건 항일무장투쟁의 선봉의 역할을 했다.
우당 선생의 일가가 소유한 부지는 서울의 노른자 땅이라 할 수 있는 명당성당 주변 일대다. 그 크기가 약 6천 평으로 당시에 화폐단위로 40만환이고, 지금 시세로 수조 원 이상이 될 것이다. 조선 갑부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지만, 빼앗긴 나라를 되찾겠다는 고귀한 ‘자주독립 정신’으로 전 재산을 온전히 항일무장독립운동에 헌납한 것이다.
온갖 고초를 겪으며 우당은 대일무장 투쟁운동 결의를 실행에 옮겼다. 옥수수 창고에서 신흥강습소를 만들고, 드디어 1911년 6월 독립운동의 초석이 된 신흥무관학교가 설립되었다. 1920년 7월 일제의 탄압으로 폐교할 때까지 약 10년간 3,500명의 독립군을 배출했으며, 졸업생들은 역사에 길이 남을 봉오동 전투, 청산리대첩 등 독립 전선의 주역으로 활동했다.
가을 기운이 조용히 스며드는 시월의 하늘은 드높고 맑았다. 재개교식이란 말이 낯설지만, 그 의미는 남달랐다. 필자는 육군사관학교 41기로 졸업을 했다. 청운의 푸른 꿈을 꾸고, 입교하여 4년 동안 사관생도 신조를 암송했다. “우리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 생명을 바친다”라는 말이 오늘따라 유난히 되새겨지고 제복을 입었던 생도 시절이 오버랩된다.
우당의 독립운동은 노블레스 오블리쥬의 전형으로 꼽을 수 있다. 상류층이었지만 나라를 위한 희생정신은 그의 투철한 ‘자유와 평등’ 사상에서 비롯되었다. 111년 만에 ‘신흥무관학교’가 재조명되고 있다. 우당의 사상이 디지털 전환시대에 글로벌 인재양성으로 승화되어 독립투사의 간절한 유지를 받들고, 이를 계기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운 상승을 기대한다.
[저작권자ⓒ 파이낸셜경제신문 | 파이낸셜경제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