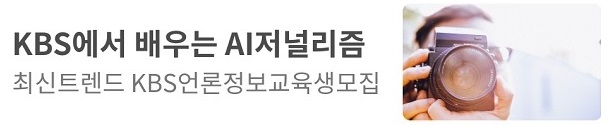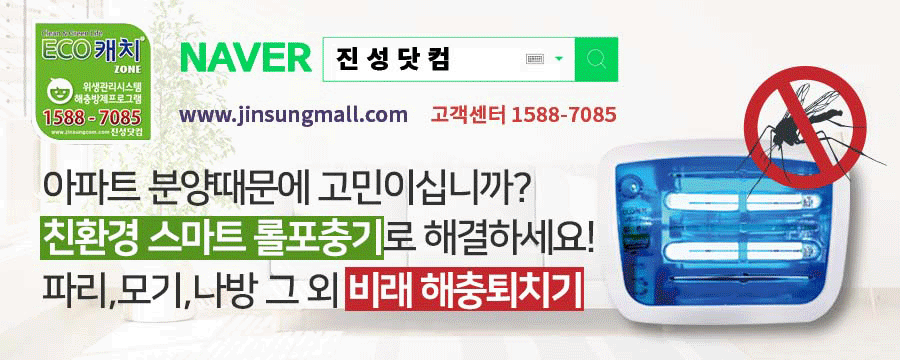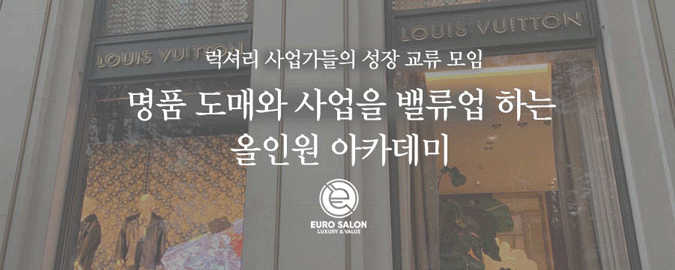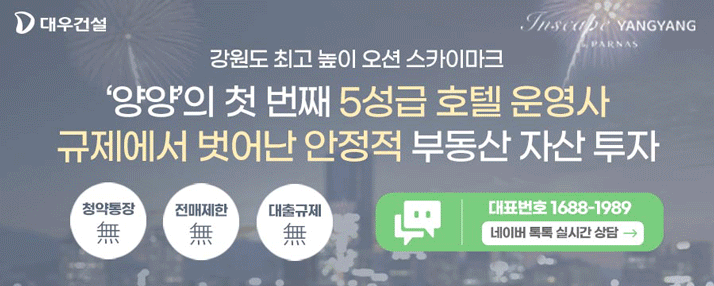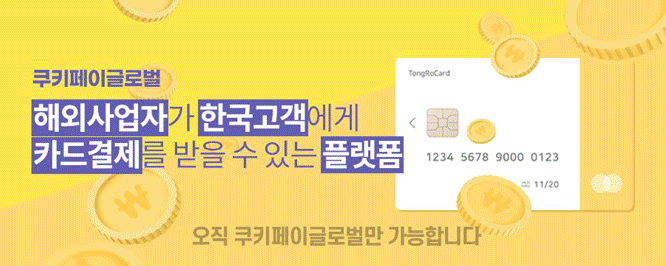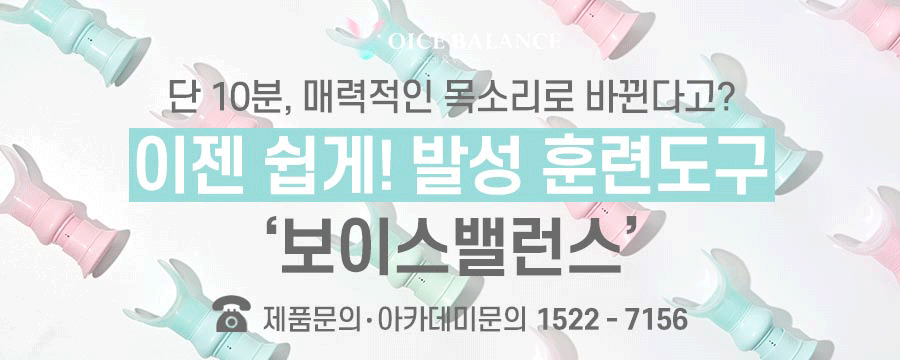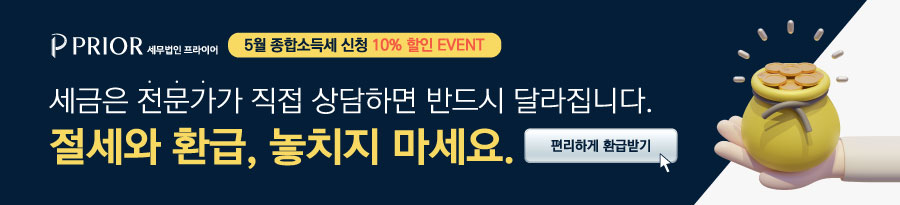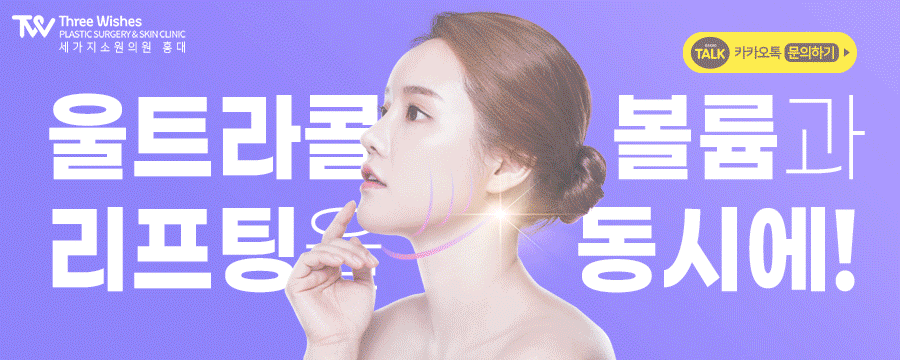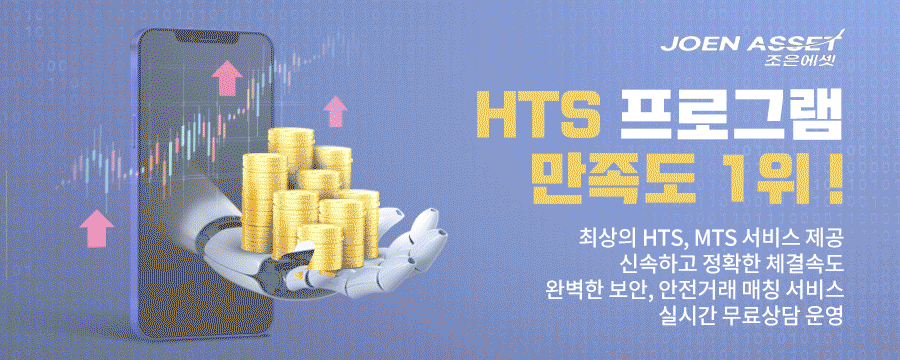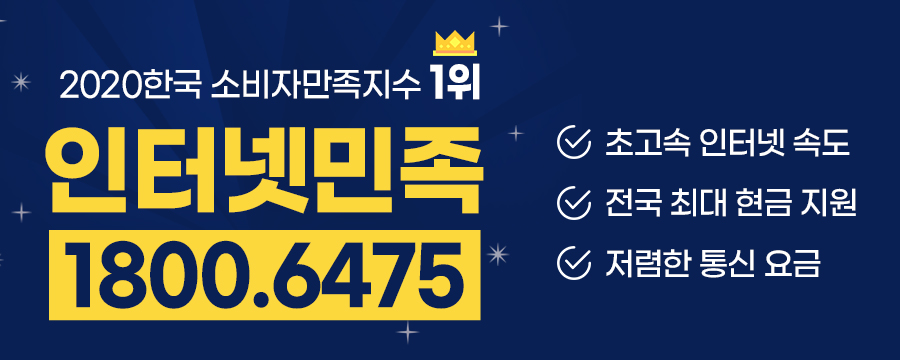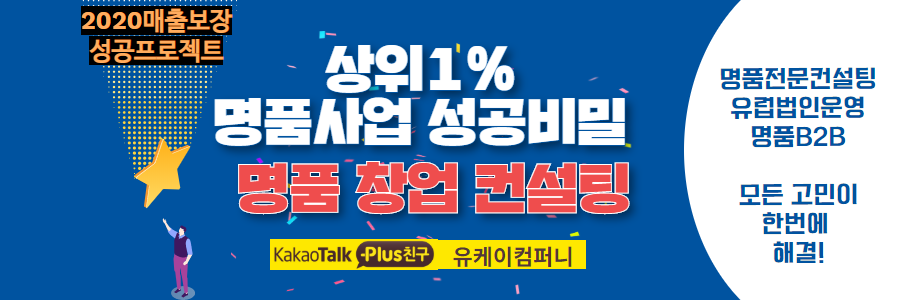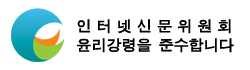침체된 한국 증시, 활성화 방안 모색 절실
[파이낸셜경제=전병길 기자] 최근 한국 증시는 글로벌 경기 침체, 외국인 투자자 이탈 등의 요인으로 인해 좀처럼 활력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심화되고, 투자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일본 증시의 개편 사례에 주목하며, 한국 증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일본은 과감한 증시 개편을 통해 시장의 질적 성장을 이끌어냈고, 이는 한국 증시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일본 증시, 2단계 개편으로 '환골탈태’
일본은 2013년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도쿄증권거래소와 오사카증권거래소를 합병하여 '일본거래소그룹(JPX)'을 출범시켰다. 이후 5개 시장을 도쿄증권거래소로 통합하는 1차 개편을 단행했지만, 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물리적으로 통합하면서 시장에 혼란을 야기했다. 최상위 시장인 제1부 시장에는 시가총액 1조엔 이상의 대기업과 10억엔 수준의 중소기업이 혼재하는 등 시장 구분이 무의미해졌고, 투자자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22년 4월, 일본은 2차 개편을 통해 5개 시장을 '프라임', '스탠다드', '그로스' 3개 시장으로 재편했다.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라임 시장은 상장 유지 조건으로 유동주식 시가총액 100억엔 이상, 유동주식 비율 35% 이상을 요구하는 등 기준을 강화했다. 스탠다드 시장은 내수 시장으로, 그로스 시장은 높은 성장성을 가진 스타트업 기업 시장으로 정의하며 각 시장의 목표에 맞는 상장 및 유지 기준을 설정했다.
개편 효과: 부실기업 퇴출, 시장 신뢰도 향상, 시가총액 증가
일본 증시 개편의 가장 큰 효과는 '시장의 질적 성장'이다. 강화된 상장 유지 기준으로 인해 부실기업들이 퇴출되면서 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졌다. 실제로 2024년 10월 기준, 신규 상장 기업 수는 60개사인 반면 상장 폐지 기업 수는 82개사로, 2015년 이후 최초로 신규 상장 기업 수를 앞질렀다.
또한, 프라임 시장의 시가총액 중앙값은 2022년 7월 573억엔에서 2024년 4월 960억엔으로 증가했다. 스탠다드 시장 역시 같은 기간 62억엔에서 82억엔으로 시가총액이 늘어났다. 상장 기업 수는 감소했지만, 양질의 기업들이 남아 시장 전체의 시가총액은 증가하는 효과를 거둔 것이다.
한국 증시, '질적 성장' 위한 과감한 개혁 필요
한경협은 일본의 사례를 통해 한국 증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의 질적 성장'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상장 및 유지 요건을 개선하여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낮은 상장 폐지 요건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한국 증시는 상장 폐지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부실기업들이 퇴출되지 않고 시장에 남아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투자자 보호, 기업 지배구조 개선, 공시 제도 강화 등 병행되어야
일본의 증시 개편은 한국 증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단기적인 부양책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한국 증시 활성화의 핵심 과제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물론, 증시 개편은 단순히 상장 요건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 회계 투명성 제고, 공시 제도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한국 증시가 일본의 성공적인 개편 사례를 참고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 늪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시장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
파이낸셜경제 / 전병길 기자 goinfomaker@gmail.com
[저작권자ⓒ 파이낸셜경제신문 | 파이낸셜경제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